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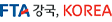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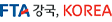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Dan Cake (Portuga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12/9
청 구 인: Dan Cake (Portugal) S.A.
대 리 인: Andrade de Matos (António Andrade de Matos, Jorge Bastos Leitão)
Nash Johnston LLP (Gregory Nash, Brent Johnston, Alex Little)
피청구국: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대 리 인: Weil, Gotshal & Manges LLP (Eric Ordway, Chip Roh, Marguerite Walter)
Siegler Ügyvédi Iroda/Weil, Gotshal & Manges LLP (László Nagy, Lászlo Nanyista, Tamás Simon, Szandra Wolf)
Professor Pierre Mayer (의장중재인, 프랑스 국적)
Professor Jan Paulsson (청구인 지명, 스웨덴/프랑스/바레인 국적)
Toby T. Landau QC (피청구국 지명, 영국 국적)
사법부인(Denial of Justice)이 인정된 얼마 되는 않은 사례 중 하나이다.1)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유일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헝가리 청산법상의 신청(화의기일 소집 신청)을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거부하여 결국 회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헝가리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사법부인이 인정되었다.
헝가리 국적의 비스킷 및 쿠키 공급업체인 Danesita Hungária Édesipari Kft(이하 “Danesita”) 는 2006년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헝가리 청산법상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들이 화의기일(composition hearing)에 모여 변제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인데, Danesita는 모회사인 Dan Cake (Portugal) S.A.(포르투갈 국적, 1996년 Danesita의 지분 과반수 인수, 이하 “청구인”)의 도움으로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부다페스트 법원에 화의기일(composition hearing) 소집 신청을 하였다.
부다페스트 법원은 Danesita에게 여러 추가 요건을 부과하며 Danesita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인은 Danesita의 자산 매각 절차를 계속하여 결국 Danesista는 소멸하였고, 이로써 Danesita의 모회사인 청구인은 헝가리에서의 투자를 상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헝가리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자의적 차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 27일 헝가리를 상대로 ICSID에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헝가리가 사법부인 형태로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하고, 자의적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헝가리에게 5,233,862.63 유로와 이에 대한 이자 및 비용의 지급을 명하였다.2)
이 사건 중재절차는 관할권 및 법적 책임(liability) 판단과 손해액(quantum) 결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3)
Agreement Between the Portuguese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Hungary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1992) (이하 “이 사건 협정”)
부다페스트 법원이 화의기일의 소집을 거부하고 청산인이 채무자회사(Danesita)의 공장의 매각을 진행하도록 한 조치.
청구인은 477,869,000 유로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4)
가. 청구인의 자회사 Danesita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
청구인은 1996년 헝가리 기업인 RELO(이후 Danesita로 기업명 변경)의 지분 86.67%를 취득하였다. Danesita는 2006년 원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끝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6년 8월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Danesita에 대한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다.5) 파산법원인 부다페스트 법원은 2007년 1월 18일 Danesita의 지급불능을 확인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청산명령을 발부하였다. Danesita가 청산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의 기각에 대한 불복 신청 또한 기각되어 2007년 10월 27일 청산명령이 확정되었다.6)
나. 화의절차 및 Danesita 자산의 매각
헝가리 법령상 청산인은 채권자위원회가 결성되어 매각절차를 연기하기로 하지 않는 한 청산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채무자회사 자산의 공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사가 자산 매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들과 합의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가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특정 요건 아래 파산법원에 화의기일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화의기일이에서 찬성함으로써 화의 합의(composition agreement)를 승인할 수 있다. 화의기일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청산절차 개시 전에 그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의 존재는 화의기일을 소집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채권자가 화의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7)
Danesita의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다. 청구인과 Danesita는 2008년 4월 10일 부다페스트 법원에 화의 제안과 채권자들과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화의기일 소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Danesita는 위 신청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채권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MKB 은행은 Danesita의 채권액 규모가 큰 주요 채권자 중 하나였는데, 이 사건 신청 전까지 청구인 또는 Danesita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청구인과 Danesita의 신청이 거절된 이후까지도 여전히 합의에 우호적이었다.8)
그러나 부다페스트 법원은 2008년 4월 22일 화의기일 소집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Danesita의 신청이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Danesita에게 7가지 추가적인 요건(이하 “이 사건 추가 요건”)의 이행을 명하였다. 동시에 청산인에게는 청산절차 공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자산 매각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9)
청산인은 Danesita의 공장에 대한 매각절차를 계속하였고, 공장은 HUF(헝가리 포린트) 370,000,000에 최종 매각되었다.10) 이후 Danesita는 법인격을 상실하여 소멸하였다.
가. 법률적 쟁점
관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이에 곧바로 본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결정이 협정상 의무 위반 중 특히 사법부인을 포함하는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또는 자의적 차별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가 집중되었다.11)
나.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중재판정부는 화의기일 소집과 관련한 채무자의 권리와 법원의 권한/의무에 관하여 살핀 다음, 부다페스트 법원이 명한 이 사건 추가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명백히 불필요하였는지를 따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1) 화의기일 소집과 관련된 채무자의 권리와 법원의 권한 및 의무
중재판정부는 청산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체 없는 화의기일 소집이 중요하였고, 이것이 청구인이 Danesita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2008년 4월 10일자 신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명시하면서, 이처럼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회의기일 소집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60일 이내에 회의기일을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화의기일 소집은 채무자의 권리라고도 지적하였다.12)
다만 중재판정부는 헝가리 청산법원이 채무자의 화의기일 소집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헝가리 파산법령에 없는 추가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보았다. 그러나 추가된 요건이 “명백히 불필요(obviously unnecessary)”하다거나, “충족하기가 불가능(impossible to satisfy)”하다거나, 혹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breach of a fundamental right)”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법원의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13)
(2) 이 사건 추가 요건과 이 사건 결정 분석
이어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상소심처럼 재심사하는 것이 판정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하면서도,14) 이 사건 추가 요건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추가 요건 7가지가 전부 헝가리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추가 요건은, 상식에 반하거나(첫번째 추가 요건), 법률의 규정을 문언에 반하여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이거나(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일곱번째 추가 요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거나(네번째 추가 요건), 충족이 불가능(여섯번째 요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화의가 성립할 모든 가능성이 박탈되었다고 보고, 이는 헝가리 파산법을 “극악하게 위반(flagrant violation)”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15)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헝가리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에서 배척하였다.16)
(3)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 사법부인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중재판정부는 헝가리 법원의 이 사건 결정이 사법부인의 형태로 이루어진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측면에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Danesita는 화의기일 소집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반면 헝가리 법원은 화의기일을 소집할 의무가 있었지만,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명백히 불필요하여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Danesita는 그 자산과 법인격의 상실하지 않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17)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 사례에서 판단기준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을 열거하며, 이 사건 결정이 이러한 표현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보았다.18)
● 심각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를 집행함(administering justice in a seriously inadequate way);
● 명백히 부당하고 신뢰할 수 없음(clearly improper and discreditable);
● 적법절차가 결여되어 사법의 적정 관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저한 부정의(manifest injustice in the sense of
a lack of due process leading to an outcome which offends a sense of judicial propriety);
● 적법절차를 고의적으로 경시하고 법적 타당성에 관한 감각에 충격을 주거나 적어도 놀라게 하는 행위
(a willful disregard of due process of law, an act which shocks, or at least surprises,
a sense of juridical propriety).
한편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가능한 구제수단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거나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적절히 이의하거나 상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적합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제도적 실패(systemic breakdown)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19)
(4) 자의적 차별 금지 위반 여부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협정이 다른 일부 협정들과는 달리 조치가 불공정할 것과 차별적일 것 모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결정은 불공정하다고 이미 판단되었다고 간단히 설시하였다.20)
다. 청산인의 매각 행위가 이 사건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
이 사건 결정이 이 사건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심리되었지만, 청산인이 이 사건 결정에 따라 Danesita 자산을 매각한 행위 또한 헝가리에 귀속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협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다투어졌다.21)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산인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명백히 부당했던 것은 부다페스트 법원이 헝가리 법령에 반하여 화의기일의 소집을 거부한 결정이지, 청산인의 매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에 따르면 청산인은 이 사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다툴 권한도 없었다. 법원이 화의기일 소집을 거부한 이상 청산인으로서는 채무자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22)
한편 청산인의 매각 행위가 정부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청산인의 행위가 헝가리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23)
이 사건 협정에는 사법부인에 관한 명시적인 문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사법부인이 인정되었다. 사법부인은 국제관습법상 널리 인정되는 원칙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처럼 협정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더라도 공정∙공평대우의무에 포함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다만 사법부인이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는 사안마다 항상 결론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국제관습법의 매개 없이 바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사법부인이 포함된다고 전제한 채 사법부인을 인정하였다.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포함되든 그렇지 않든, 사법부인이 특히 엄격하게 판단되는 청구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 사건 판정문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보통 사법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outrageous” 또는 “egregious”라는 최상급의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따라서 단순한 규범 위반만으로는 사법부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본질적인 절차적 정의 침해’ 혹은 ‘기본적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사법부인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법계를 불문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현저하게 잘못된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비위행위, 예컨대 판사가 뇌물을 받고 한쪽 당사자가 작성해 온 판결문 초안 그대로 판결하는 행위(Chevron v Ecuador) 정도가 되어야 사법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이 사건 중재판정부도 헝가리 법원의 이 사건 결정이 “극악한 위반(flagrant violation”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잘못을 시정할 수도 없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제도적 실패(systemic breakdown)”라고 평가하였다. 이 사건 결정이 단순히 헝가리 청산법령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는, 심각하게 잘못된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 행위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사법부인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사법부인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대로 정리된 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부인 사례에서 흔히 인용되는 문언과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구체성을 가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법부인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개별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헝가리 법원이 청구인의 화의기일 소집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회생할 수 있었던 회사가 제대로 된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소멸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은 ‘법인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판단의 주요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Chevron v Ecuador 사건(판사가 뇌물을 받고 일방 당사자가 작성해 온 판결문 초안대로 판결함)에서처럼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는 물론, 비위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의 중대성도 사법부인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일응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김의현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Denial of Jusitce라는 용어를 “사법부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사법부의 조치만이 Denial of Justice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Denial of Justice를 “사법부인”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되므로, 다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도 “사법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Dan Cake (Portuga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12/9, Decision on Applicant’s Request for the Continued Stay of Enforcement of the Award, 25 December 2018, para. 1.
3) Dan Cake (Portuga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12/9,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24 August 2015 (이하 “Decision”), para. 19. 다만 손해액 결정에 관한 판정(Dan Cake (Portuga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12/9, Award, 21 November 2017, [Unknown])은 공개되지 않았다.
4) Decision, para. 62.
5) Decision, paras. 30-32, 37-39.
6) Decision, paras. 40-44.
7) Decision, paras. 45-48, 53.
8) Decision, paras. 45, 48-53.
9) Decision, paras. 54-55.
10) Decision, paras. 56-57, 59.
11) Decision, paras. 80-82. 청구인은 당초 완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위반,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 금지 위반 또한 주장하였으나 중재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법부인을 포함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과 자의적 차별 금지 위반에 주장을 집중하였다.
12) Decision, paras. 92-98.
13) Decision, paras. 98, 103-117.
14) Decision, para. 117.
15) Decision, paras. 118-139, 142, 145.
16) Decision, paras. 140-141.
17) Decision, para. 145.
18) Decision, para. 146.
19) Decision, para. 147-154.
20) Decision, paras. 155-157.
21) Decision, paras. 86-89.
22) Decision, para. 160.
23) Decision, paras. 158-160.
 William Ralph Clayton, William Richard Clayton, Douglas Clayton, Daniel Clayton and Bilcon of Delaware, Inc.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2025.04.02
William Ralph Clayton, William Richard Clayton, Douglas Clayton, Daniel Clayton and Bilcon of Delaware, Inc.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2025.04.02
 Vladimir Berschader and Moïse Berschader v. The Russian Federation, SCC Case No. 080/2004
2025.03.17
Vladimir Berschader and Moïse Berschader v. The Russian Federation, SCC Case No. 080/2004
2025.03.17
 Festorino v. Poland (SCC Case No. V2018/098)
2023.10.26
Festorino v. Poland (SCC Case No. V2018/098)
2023.10.26
 Nachingwea v. Tanzania (ICSID Case No. ARB/20/38)
2023.10.26
Nachingwea v. Tanzania (ICSID Case No. ARB/20/38)
2023.10.26